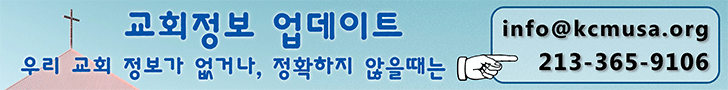세계여행 [조명환의 추억 여행(20)] 북 아메리카의 ‘작은 프랑스’ 퀘벡
페이지 정보
본문
캐나다... 우리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먼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과 가장 길게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나라란 점 때문에 지리적 친근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왕래가 되지 않는 곳이기에 먼 나라처럼 느껴진다. 서부지역 한인들은 그래도 뱅쿠버나 빅토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지구촌 최고의 청정지역이라느니 혹은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소문 나 있는 밴프나 재스퍼스는 그런대로 왕래가 있는 편이다. 또 동계 올림픽이 열린 곳으로 유명한 캘거리,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에드먼튼 등도 비교적 왕래가 잦은 편.
미국을 제외하고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크고 한국인 교회가 가장 많은 곳도 아마 캐나다일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토론도, 뱅쿠버, 몬트리올 등지에는 미국 못지않은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한인 교회들도 많다.
오래전 캐나다 서부지역은 한 두번 여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동부지역은 가 본적이 없었다. 온타리오 주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빼고는. 그래서 찾은 곳이 퀘벡(Quebec)이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물론 영토가 넓다. 땅 부자인 러시아에 뒤이어 세계 2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다. 지도를 펼쳐보면 미국 국경지대가 대부분 그린칼라로 색칠이 되어 있고 위쪽은 모두 흰 백색이다. 사실 별로 쓸모없는 툰드라지역 눈 덮인 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인가? 그렇지는 않다. G8 경제 대국에 족보를 올리고 있는 세계 8대 선진국이요, 경제대국이다.
서부지역을 방문 했을 때는 몰랐지만 퀘벡을 방문 했을 때는 우선 불어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 퀘벡하면 퀘벡 주가 있고 퀘벡시티가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인데 10개 주 가운데 이 퀘벡 주가 가장 몸집이 크다.
언덕바지에 자리잡은 퀘벡은 로워 타운, 어퍼타운으로 나뉜다. 로워타운은 카페의 천국이다
그런데 이 퀘벡 주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 아마도 영어가 푸대접을 받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일 것이다. 간판에도 프랑스어가 먼저이고 그리고 영어는 잔챙이 글자로 그 밑에 왜소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 한국 목사님에게 들으니 여기 퀘벡에는 ''랭귀지 캅''이라는게 있어서 불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캅도 가지가지다. 요즘 LA에선 정해진 시간외에 잔디에 물을 주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워터 캅''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나라엔 ''랭귀지 캅''이라? 그럼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유창하게 발설하면 잡혀 가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아니고 불어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이 퀘벡주민들의 히스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맥도날드에 가서도 ''잉그리쉬 맥머핀''을 달라고 하면 어여쁜 아가씨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알아듣지 못할 불어로 냅다 쏘아붙인다. ''잉글리쉬''란 말 때문에 기분이 잡쳤다?
퀘벡근처엔 이런 시원한 폭포도 있다. 이름은 몽모렌시 폭포
몬트리올은 그래도 불어, 영어가 형제노릇을 하고 있지만 퀘벡 시에 가면 아예 간판이 모두 불어 투성이다. 우리야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길들여진 몸이라 대학 불어과를 졸업했거나 불란서 대사관에서 일한 적이 있다거나 아버지가 불란서 대사를 역임한 자제들이 아니고서야 불어는 영 딴나라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레스토랑에 가면 불어 메뉴와 영어메뉴가 따로 있다. 공손하게 영어 메뉴를 달라고 해야 한다.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 친절하기는 그지없지만 유명한 성당 이름 하나를 외우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예컨대 몬트리올에 있는 로마 바티칸 성당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건축한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이름은 Cathedrale Marie-Reine-du-Monde, 이를 어떻게 알아먹으란 말인가? 영어로는 The Cathedral-Basilica of Mary, Queen of the World, 영어로도 이름이 줄줄이 사탕이라서 헤깔리는데 불어로는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더구나 이 성당을 지은 몬트리올 제2대 주교 이름 역시 불란서 사람. 그래서 외우고 적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 지수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외우고자하는 학구적인 노력을 아예 포기하게 만든다.
뉴욕에서 아메리칸 이글이란 소형비행기를 타고 몬트리올로 가는 비행기에서 프렌치 회화 책을 들고 몇 마디 공부를 하려고 애썼지만 효과는 아주 별로. 뉴욕에서 몬트리올 가는 1시간 거리에서 머리에 남는 것은 ''봉쥬'' 한마디였다. 지난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애꿎은 봉지아(Bom dia!)란 말이 얼마나 내 입에서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폴추기스로 봉지아는 굿모닝, 여기 퀘벡에서 봉쥬는 그냥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거리나 호텔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질러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언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로워타운에서 바라본 샤토 프랑트낙 호텔의 근사한 모습
이렇게 영어가 천대받고 불어가 판치는 퀘벡에는 영어를 쓰는 영국인들에 대한 아픈 프랑스인들의 패배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퀘벡하면 우선 우리는 ‘작은 프랑스’를 떠올린다. 건축에서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랑스 전통이 그대로 스며있는 도시다.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 주 뉴 올리언스는 프랑스 후예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케이전(Cajun)이라 부르는 이들은 캐나다 프랑스 식민지 아케이디아(Arcadia)출신의 프랑스인 후예들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루이지애나는 프랑스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영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되어 흔히 케이전 문화하면 프랑스 전통과 영국과 미국식이 짬봉된 문화를 말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다.

퀘벡은 성으로 둘러쌓인 도시다.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곳에 십자가도 서 있다
퀘벡에 들어서면 우선 세인트 로렌스 강, 불어로는 ‘생 로랑’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이 강은 크기도 하지만 대서양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는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캐나다가 영국 연방으로 남아있어 결국 역사는 영국 쪽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어디 유럽대륙의 영원한 앙숙,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여기뿐이었겠는가? 16-17세기를 거쳐 유럽의 식민지 개척시대가 지구촌에 만개하면서 유럽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여기저기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퀘벡을 지금도 북미의 지브랄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도 이 둘은 지독하게 싸울 만큼 싸웠다는 얘기다.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자. 북 아메리카에서 유럽인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 중 하나로 알려진 이 퀘벡은 1535년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처음 이곳에 도달하였다고 알려진다. 그 후 1608년 프랑스 탐험가 사뮈엘 드 샹플랭이 유럽인 정착지를 세웠고, 1629년 영국이 차지했다가 곧 다시 프랑스에 넘어갔다. 1690년 프랑스의 프롱트낙 공작은 필립스 제독이 이끄는 영국군을 물리쳐 퀘벡시를 프랑스령으로 만들었으나 1759년 제임스 울프(James Wolfe)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에게 패해 다시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유명한 ‘아브라함 평원 전투.’ 그 후 1774년 파리강화조약 체결이후 영국에게 주권을 빼앗겼으나 퀘벡에 살고 있는 프랑스계 주민들은 프랑스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고 불어를 사용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리하여 프랑스 문화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전쟁을 걸어왔다. 1775년 미국의 리차드 몽고메리 장군과 아놀드 베네딕트 대령의 침입 실패 후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영국군은 방심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었다. 그래서 퀘벡은 북미에서 유일하게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되었고 이것이 퀘벡시의 가장 큰 특징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퀘벡은 영어보다는 불어가 환대를 받는다
퀘벡 주는 4억 인구의 시장으로 그 중 25%인 1억 1천만이 미국인이다. 퀘벡의 일인당 GDP는 OECD 19위로 스페인보다 높고 독일, 이탈리아와 유사한 수준. 항공 우주 생산량 세계 6위에다 전 세계 신문 용지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퀘벡시는 캐톨릭 인구가 지배적이다.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예술의 도시처럼 도시 번화가엔 그림들이 즐비하고 관광객을 위한 식당들 역시 발이 차일 정도다. 1985년 유엔의 세계유산문화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퀘벡 시는 세인트 로렌스 강가에 접한 저지대, Lower Town과 고지대 Upper Town으로 구분되어 있다. 어퍼 타운에는 17세기 이래의 프랑스 양식의 건물이 즐비하고 18세기 후반, 영국이 구축해 놓은 성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북 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문 성벽 도시 경관을 갖추고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샤토 프롱트낙 등 독특한 양식의 건물이 많은 구 시가지는 역사박물관처럼 느껴진다. 성당, 동상, 고풍스러운 호텔들이 즐비하다. 로워 타운은 주로 ‘먹자 골목.’ 불어를 모르면 영어 메뉴를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 가면 대개 촌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대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와 불어정도는 완벽한 수준이니까. 주민은 대부분 백인이고 19세기 후반에는 영어 사용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2% 이하에 불과하다고 한다.
혹시 개신교회 건물은 어디 없을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생판 알 수 없는 불어 싸인판을 보고 여기 저기 더듬거렸으나 겨우 성공회 건물 하나 근사한 것 발견하고는 거의 다 캐톨릭 성당뿐이었다. 2차례나 퀘벡의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두 번 모두 표가 모자라 실패했다고 한다. 만약 퀘벡 자치 공화국이 성립되어 완전한 불어 생활권 독립국가로 변모한다면 수많은 대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긴 탈출의 행렬이 시작될 것이란 불안한 예고 때문에 퀘벡 주민 대부분은 “지금 여기사 좋사오니”에 만족하며 사는 듯 했다.
관련링크
-
크리스천 위클리 제공
[원문링크]
- 이전글[CA] 노동절 연휴, 가까운 테메큘라 방문? 와이너리와 열기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22.08.24
- 다음글[KY] 켄터키 노아의 방주 - CBSN 창조 탐사여행 답사기(II) 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