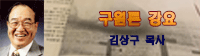[김영국 목사의 음악목회 이야기] 음악을 마주하며(Facing the Music)
페이지 정보
본문

저는 예배에 대한 논쟁이 늘 있어왔다는 사실로 인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음악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서도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종교음악의 역사를 기록해 온 동안, 그것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기록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예배음악(liturgical music)에서 어떤 언어와 멜로디를 사용하느냐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불붙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와 멜로디어야 하는가, 아니면 로마가톨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르네상스까지 이런 멜로디들 중 일부는 어떤 이들에게는 난해하게 들리는 대위법에 포함되고 또 요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도 순전한 인간의 목소리만이 기독교 예배의 유일한 악기여야 할까요? 교회에서 파이프와 현악기와 트럼펫을 포함시키는 급진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디오니시안 의식(그리스의 주신제)과 흡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하에 대한 비평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음들! 지나친 복잡성!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인위적인 면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심플하고 감미로운 멜로디 라인이지, 이렇게 빽빽한 대위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자연을 반영하는 음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강경한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강력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 예배에 쓰이고, 믿는 자들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의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당시에 누가 담당하고 붓을 들고 있었는가에 따라, 그리고 누구의 정치적 목소리가 중요한가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음악 신학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연결 지구촌과 사이비 평등주의 윤리는 우리를 옛날보다 엄청 쉽게 음악에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곳 저곳 걸어 찾아 다니거나 , 라디오나 mp3 플레이어를 틀면, 우리는 가엾은 모자르트가 그의 짦은 전 생애 동안 들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음악을 하루 저녁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흐일까 브람스일까, 찬송가일까 힙합일까? 가톨릭 종교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팔레스트리나(Palestrina)일까 팝일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드는 음악을 통하여 뜻을 나타냅니다(“의미”를 둡니다). 우리는 마치 유전자의 일부인 것처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태어난 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우리의 깊은 비전을 표현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특정한 음악에 끌리고 매료되기까지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음악 입문서의 한 곡이든지, 초보자를 위한 바하 곡이든지, 아니면 학교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외워서 부른 캐롤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할 때 저는 그 날과 계절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리학적 혹은 심리학적 애착과 선호가 제가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 맥박이 뛰고 가슴이 흥분으로 부풀어 올랐던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신학, 욕구, 예술, 의미: 이것들은 확실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갈등하던 어거스틴까지도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찬송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은 다른 음악으로 다르게 쉼을 얻는 것이고, 또한 Daniel Levitin도(in his 2006 book, "This is Your Brain On Music") 음악에 대한 취향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주일 날 교회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찬송과 노래가 불려지는가에 대하여 충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의 전심(whole self)에 대하여 배울 것이라면, 이제는 음악을 중심으로 그 의미에 대하여 설득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난 이게 좋아”, 혹은 “난 이게 싫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연계성들, 즉 소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음악이 인구통계학적 집단과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느끼는 방식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팔레스트리나의 모테트(Motets)를 들을 때, 우리는 연주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어떤 거대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상호 연결된 완벽한 교감의 일부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블루스(the blues)의 재즈 리프(jazz riff)도 이와 같아서, 색소폰 연주자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황홀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임스 맥밀란의 "십자가상의 칠언"에서는 적막함과 황폐함을 교감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쉽게 반복되는 후렴의 포크 발라드(the folk ballad)는 연습 없이도 노래할 수 있어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그저 은근슬쩍 당기는 음악으로 다정함을 교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서로의 음악을 듣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나은 경계선 돌파(boundary-breaker)는 없습니다. 때때로, 예배의 시간이 그 공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성찰을 하기에는 예배가 너무 민감하고 신중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음악은 단지 악보 위의 콩나물 대가리(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며, 그 행하는 과정은 따뜻하고, 관대하며,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과 소리와 음악을 마주할 때,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좀 더 주의하여 유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평가해보고, 축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노래와 사뭇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땐, 우리는 진실로 온 우주 만물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이해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rtin Jean is director of the Yale Institute of Sacred Music, Professor in the Practice of Sacred Music, and Professor of Organ. He has performed widely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이 article은 2015년 발간된 Yale Divinity School의 매가진 Reflection(p28)에 실린 것을 필자가 번역한 것입니다. ]
필자 김영국 목사는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공부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이며 스승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 동안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지금은 저서와 번역, 그리고 웹사이트 매거진 “예배음악”(Worship Music)에서 음악목회에 관한 칼럼을 쓰면서 자신의 음악목회 경험과 사역을 나누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장로교출판사가 펴낸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가 있다.
- 이전글김한요 목사의 코로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 3 – 가족의 재발견 21.03.16
- 다음글신구원론강요(135) 찬송중 임재하시는 성령 21.03.14